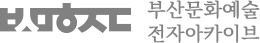예술현장에서 바라는 문화정책
고리-집-길로 이어진 가온
신용철(시골큐레이터)
1. 시골큐레이터
나는 스스로 시골큐레이터라고 부른다. 내가 일하는 곳은 부산 민주공원이고 맡은 자리는 학예실장이고 하는 일은 학예연구와 전시기획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도시 부산에서 일하는 큐레이터가 왜 시골큐레이터인가? 나는 되묻는다. 한국은 서울 빼고는 다 시골 아닌가? 나는 ‘시골큐레이터’란 말로 서울을 도발하고, 부산을 도발하고, 서울바라기를 도발하고, 부산바라기를 도발한다. ‘시골큐레이터’라는 말그물은 모든 중심주의(centricism)를 도발하는 말뚝이 채찍이다.
올해 이슈페이퍼의 주제 ‘부울경메가시티와 엑스포’, 이번호 주제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라는 맥락을 가늠하기 위해서 지난 이슈페이퍼를 훑어보았다.
시골큐레이터에게 ‘부울경메가시티’라는 말은 자못 거북하다. 시골큐레이터가 바라는 바는 모든 시골끼리의 고른 연대이다. 문턱은 있지만 문과 길로 이어져 있는 집들, 높고 낮은 언덕이 갖가지 눈길로 만나는 들판 같은 그런 것이다. 연대의 방향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걱정은 ‘변증법적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을 강조하는 차재근의 생각(<이슈페이터> 15호)과 이어져 있다.
풍물굿을 이르는 ‘전라좌도굿/전라우도굿’, 수군 통제영을 일컫는 ‘좌수영/우수영’이라는 말밭으로 말길을 열어 본다. ‘좌/우’의 이항대립으로 빚어지는 방위의 위상학은 무엇인가? 우수영은 지금의 호남 지역, 좌수영은 지금의 영남 지역이다. 지도에서 보면 우수영이 좌(왼쪽)이고, 좌수영이 우(오른쪽)이다. 지도를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는 이미 대동여지도를 그렸던 민족이다. 지도 위에서 좌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좌도/우도, 좌수영/우수영이라는 쓰임새에서 왜 굳이 좌우를 뒤바꾼 것일까?
여기에서 좌우를 가르는 위상의 시점은 한성(서울)이다. 서울에서 남도를 바라보았을 때, 지도 위의 방위는 뒤집힌다. 하나의 중앙과 나머지 지방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앙을 바탕으로 모든 지방을 위계화하는 구조이다. 나는 이런 ‘봉건제적 시각의 위상학’이 여전히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낡은 구조틀이라고 생각한다. ‘근대적 시각의 위상학’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구조틀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에게 근대문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직 근대는 있지만 없다. ‘시골큐레이터’라는 말그물은 모든 근대적 시각 체계를 직조하는 베틀이다.
2. 고리에 고리를 무는 고리
시골큐레이터는 연대의 아이콘이다. 연대하는 이는 듣되 고개를 빠뜨리고 들여다 들어야 하고, 보되 눈손을 뻗어 만져야 하며, 맡되 코를 묻고 맡아야 한다. 사람이 고리이고 집이고 길이다. 공간, 기관, 정책은 ‘고리-집-길’을 이어주는 ‘바람-햇빛-비’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한 남송우의 글(<이슈페이퍼> 14호)은 ‘바람-햇빛-비’의 틀과 쓰임새를 갈무리하는 좋은 글이다. 다만 울산 예술과 활발하게 연대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어 바로잡으려 한다. “울산에는 고래문화재단, 울주문화재단(준비 중)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진술은 글이 실린 2022년 현재 사실이 아니다. 울산문화재단(2016), 울주문화재단(2020)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고쳐주기 바란다.
시골큐레이터는 제 스스로가 플랫폼이고 허브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퍼져나가고 모이는 고리이다. 나는 시골큐레이터로서 모든 예술기획을 이런 바탕에서 설계하였다.
민주공원은 민중미술 거점 미술관이다. 거점이지만 중심은 아니다. 열린 거점으로서 플랫폼이고 허브이다. 2013년 시작한 ‘민중미술전’은 ‘민중미술’이란 미적 태도를 바탕으로 계층의 연대, 장르의 연대, 지역의 연대를 꾀하였다. 올해 10년이 되었다. 지역의 연대는 ‘민중미술의 현장’이란 섹션 안에 펼쳤다. 지역미술 담론을 나누는 프로젝트 ‘함께가는 그림판’은 2020년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전시를 계층, 장르, 지역 연대의 마음으로 만들면 시각의 들판은 갖가지 눈길이 만나 낯선 언덕을 이룬다.
3. 고고학자의 마음 : 만지는 결, 더듬는 켜
영화 <잉글리쉬 페이션트>(The English Patient, 1996) 첫 시퀀스. 고고학자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연인을 어두운 동굴에 눕힌 채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났다 전란에 휩싸여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영화를 본 이후 나는 지금까지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캄캄한 동굴에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누워 연인을 기다리다 끄끝내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프다.
우리의 미적 근대는 봉건제와 식민지 근대화 어름에서 홀로 어둔 동굴에 버려진 채 아직 묻혀 있다. 예술 마당을 여는 사람은 고고학자의 마음으로 예술의 씨줄과 날줄을 가늠해야 한다. 동시대 예술 현장의 결을 온몸으로 매만져야 한다. 동굴의 속통을 더듬어 예술의 켜를 캐내야 한다. 결과 켜는 예술사를 균형 있게 직조하는 씨실과 날실이다. 우리시대 예술 마당을 만드는 설계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없는 가온, 어디든 가온, 때론 가온, 열린 가온
그리하여 가온이다. 본디 가온은 없다. 가온이 없어져야 가온이 산다. 어디든 가온이다. 모든 것이 가온이다. 가온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늘 가온이지 않다. 때때로 가온이고 때때로 가온이 아니다. 어즈버 열린 가온이다. 모든 가온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열려 있어 어디로 들어가도 나올 수 있는 고리-집-길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걸려 있다. 우리는 이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