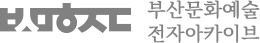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이동열 (삼인행 대표)
#섬 들여다보기
섬에 들어와 정착한 지 12년 차, 강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하구언에 다양한 어류가 많이 모여 살 듯이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섬으로 정착한 내게도 섬과 뭍을 드나들며 생긴 다양한 궁금증과 물음이 매일 자라며 서식하고 있다.
그 중 섬과 섬사람, 바다가 있다. 강은 뭍을 구획하면 흘러서 마을과 행정구역 등의 경계로서 서로의 권리와 상대의 책임을 요구하지만, 바다의 경계는 섬이나 연안의 생업을 잇는 사람들과 몇몇 전문가나 최신의 위성 장비 같은 기계가 아니면 경계도 불분명하고 권리와 책임도 힘의 작용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 불분명한 권리와 책임 속에서 거친 자연환경과 고립된 외로움에 내몰린 섬과 섬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다만큼이나 거칠게 만들었고, 그리 보였다.
멀리서 섬을 바라보면 섬과 어울린 바다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양쓰레기, 가뭄, 슈퍼태풍, 해양생태계 파괴, 멸종 등, 섬은 우리 시대가 떠안은 모든 환경 문제의 표본이고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런 섬의 환경 속에서 나처럼 뭍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나, 여행자들처럼 잠시 섬을 스치고 갈 이방인들이 식자의 편견만 가지고 그 섬과 섬 주민들에게 기후, 해양, 환경 생태와 같은 말이 갖는 위중함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이변들의 책임 일부가 당신들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쥐보다 같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리 말하기 전에 섬과 섬 주민도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음에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뿔난 섬 프로젝트’,
플라스틱이 없는 섬(Plastic no’N Seom), 쓰레기로 뿔(화)이 난 섬이라는 뜻의 프로젝트는 섬 주민과 이방인인 여행자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섬 주민들이 이를 통해 섬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보자는 섬 정착 이주민 관점의 출발이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매일 재생산되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도 ‘기후 위기’의 큰 명제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는 엄중함의 상징적 자각을 스스로 해보자는 취지의 공정여행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우선 함께할 주민들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섬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여행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한명 한명 찾아다녔다. 그렇게 모인 이들 중에는 섬에서 태어난 이들도 있었고, 뭍에서 태어나 섬으로 살러 들어온 이도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섬 주민인 동시에 섬 밖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섬을 떠나본 경험이 섬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섬지니협의체’라는 주민 조직을 먼저 만들었다. 섬에서 소수인 채 살아가는 이들과 이제 청년들 다 떠나고 늙은이 몇몇 모여서 섬의 아침을 여는 모습이 섬에 얹혀사는 것이 아닌 섬을 지고 사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9개 섬, 40명 정도의 주민들이 각 섬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 우리의 이야기에 상응해주는 주민을 만들자는 계획으로 3년째 서로 모여 의논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들과 섬마을 영화제와 뿔난섬 음악회를 궁리했다. 섬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회복과 기후 행동이라는 주제 의식 아래 섬의 곳곳을 공연장으로 활용했고, 불필요한 무대의 가설 없이 파도 소리와 새소리, 주민의 뱃소리 모두를 공연 일부로 녹여냈다. 낮에는 해안의 쓰레기를 줍고, 식사에는 모인 이들이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모인 쓰레기를 쌓아두고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섬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기후 위기와 해양환경의 문제가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함께 공유하길 바랐다.
섬의 해안을 걸으면 발신지 불명의 온갖 종류 쓰레기와 이질적인 부유물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뉴월의 벼보다도 빨리 자란다. 그런 것들을 줍고 있을 때, 어느 주민은 ‘또 쌓일 건데 뭣 하러 쓸데없는 일을 하냐“며 말을 툭 건넨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치만큼 쓰레기는 안 쌓이겠죠“ 라며 웃고 만다. 그 쓰레기 중에는 섬 주민에게서 나온 것도 많다. 모든 쓰레기가 그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중에 양식장의 스티로폼이나 폐그물과 같은 어구들은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오 년째 물메기가 잡히지 않아 빈 채로 녹슬어가는 추도의 물메기 덕장이나, 담그면 대물 감성돔이 손 저리게 올라오던 것이 먼 전설이 되어버린 욕지도의 갯바위나, 국립공원 표지판 너머로 바스러진 굴 양식장의 스티로폼 조각들이 선착장 돌 틈마다 빼곡한 추봉도의 갯가에 살면서도 이것이 지금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
섬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그들의 외로움에 위로를, 그들의 가련함에 눈물을 보낸다. 그 섬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산업혁명의 시대, 변화되는 세상과 단절된 채 탄광의 어둠 속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손 새장 속에 들린 카나리아가 떠오른다. 가스가 차오르면 민감한 카나리아는 고통에 지저귀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어쩌면 무너지고 죽어간 탄광 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느 자본가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순장 당했을 그 새 한 마리가 마치 내 앞의 선 섬과 섬 주민들 같았다.
부산 해안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몇 해 전부터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바닷물이 높아지는 재앙적인 기상의 반복 속에서 바닷가 어딘가에 성벽 같은 방파제를 쌓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한다. 기후 위기의 최일선인 섬에는 바닷물이 몇 치 높아지면 포구 앞 구판장의 문지방 앞까지 물이 찰랑거릴 것이다. 몇 치 더 높아지면 섬 할매 집 마당에 정지 아궁이가 잠길지 모를 일이다. 이들을 위한 방파제는 누가 준비하고 있는가? 어느 하나 제대로 연민해 주지 않는 섬 사람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순장인가?
#우리의 행동은 계속 이어진다
바다에 잠겨버린 시대, 문화는 어느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뿔난섬 음악회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섬에 밀려든 하루 이틀치 만큼의 쓰레기를 치울 뿐이다. 섬 주민들에게 며칠 동안 공연을 함께 나누고 밥 한 끼 대접하며 외로웠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뿐이다.
섬 주민들이 알아차리거나 혹시 아직은 못 알아차려도 우리의 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기후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인지하고 이겨내려는 기후행동의 시간보다 기후재앙이 더 빨라서 우리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채 이 행성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루치의 쓰레기를 치우면 하루만큼은 더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루만큼 위로를 받으면 하루만큼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섬 주민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여행자들과 함께 뿔난섬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연의 생명 안에서 인간이 어떤 것의 주인도 될 수 없고, 누군가의 의지로 함부로 죽임을 당할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나쁜 섬은 없다.


<뿔난섬 음악회, 그리고 비치코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