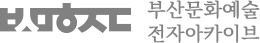사상 이주민 반상회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이주가 우선이다.
‘이사’라는 말과 ‘차별’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결합되기 매우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말은 너무 쉽게 결합되어 폭력이 된다. 텃새라는 말이나, 지역감정이라는 말,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비유가 그렇다. 그런데 이런 말은 모두 ‘정착’을 중심으로 고안된 말이다. 과연 우리 삶을 정착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을까.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 땅을 떠났고, 부처도 자기 왕국을 떠났다. 주몽도 그랬다. 단군 신화 역시 다르지 않다. 인류의 역사가 떠남에서 시작한다는 것, 떠나기 전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기록도 없다는 것은 정작 인류의 역사를 ‘이주’ 중심으로 봐야한다는 뜻 아닐까. 이주는 새로운 것과의 대면을 전제로 하니, 혼종성과 다양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하늘 사람과 땅 사람, 신과 짐승이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그렇다. 마치 이방인을 환대한 문화가 역사를 새로 쓸 자격이 있는 듯, 거의 대부분의 신화와 역사는 이주와 섞임(hybrid) 그리고 이를통한 새로운 삶의 창조로 시작한다. 인류의 역사가 모두 이런 식이라면 이주민이 아닌(이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주가 있기에 정착이 있다. 이주가 정착에 우선한다. 부산도 이를 증명한다.
부산, 이주민의 도시
이주하는 사람은 새롭고 더 나은 삶을 꿈꾼다. 이주와 거주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다. 이주가 존엄하고 행복해야 인간적 삶이 완성된다. 부산의 경우를 보자. 부산은 실로 이주민의 도시다. 관문 도시인 탓에 부산에 들고나는 사람들은 많았다. 해방 후 귀환한 사람, 전쟁 통에 피난 온 사람, 산업화 시대에 이촌향도한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부산에는 유독 향우회가 많다. 부산을 제대로 보려면 이주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다양성과 경계예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문화 다양성은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한다. 부산이 이주민의 도시라는 점은 그
만큼 창조적 잠재력이 많다는 뜻이다. 그 잠재력이 부산 사상구에 거대한 복류(伏流)가 되었다. 이 복류를 시추해, 환대의 물꼬를 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계 예술(border art)의 사례를 보자. 북-중미 경계 예술가들은 미국 국경 봉쇄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는 예술 작업을 선보였다. 그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박힌 말뚝 사이에 시소를 설치해, 양국 어린이들이 서로 마주보며 시소를 타도록 했다. 어떤 이는 인간 대포가 되어 국경을 넘었다. 이들은 이주가 차별과 폭력을 돌파하는 생의 도약이며, 인권은 국경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부산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상 이주민 반상회
현재 사상에서는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 진행하는 〈이주민 반상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사상구가족센터〉, 〈이주민문화센터〉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반상회를 열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한국 사람들이 격주로 모여 자기 나라의 명절과 축제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아시아 절기 달력(예상) 같은 콘텐츠가 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내 안의 오리엔탈리즘
이주민 반상회는 이주민이 발화자가 되어 선주민이 이주민의 문화를 경청하는 대담형 강좌다. 8월 3일이면 8번째 미얀마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강좌를 운영하면서, 나는 아시아가 너무나 비슷하지만 너무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새해를 기념하는 것만 해도 그랬다.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삼는 나라, 양력과 음력 모두를 새해로 삼는 나라, 음력 1월 1일을 새해로 삼는 나라, 심지어 새해가 양력으로 4월인 나라 등, 각 나라의 전통과 풍습이 너무 달랐다. 하지만, 이날 조상을 기리고, 가족을 만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점은 너무도 비슷했다. 나는 왜 이토록 아시아를 몰랐을까. 가까이 있어서 여행을 가도, 나는 정작 서구에 비해 아시아를 너무 몰랐다. 심지어 굳이 아시아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시아에 사는 오리엔탈리스트였다.
타인이라는 거울
이분들이 일깨운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분들이 명절과 축제를 강의하면서 하나 같이 한국을 노잼국가라고 했다. 부산과 한국에 ‘축제’는 많지만, 정작 ‘축제다운 축제’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 축제문화가 음주라는 문화 획일성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이분들이 말하는 축제는 정말로 다종다양했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는 섬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각자 자기만의 축제를 연다. 필리핀은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나라다. 테스 씨는 우리더러 필리핀 갈 때 휴양지만 가지말고, 마을로 찾아가 축제에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내게 그 말은 필리핀을 단순히 관광지로만 소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 필리핀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고, 소통하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 외에도 네팔의 물감 축제 홀리, 몽골의 나담 축제, 중국-캄보디아의 용선 경주 및 배 축제 등, 이분들이 말하는 자국의 축제는 한국의 축제와는 판이했다. 한국의 축제는 어쩌다 저리 앙상한 축제가 되었을까. 한국사회는 『피로사회』라는 독일 발 서적에 『과로사회』로 답한 바 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이 과로사로 귀결된 상황에서,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은 이미 먼 이야기가 되었다. 놀이가 앙상해지다 못해 사라진 상황에, 이분들이 경종을 울렸다. 한국의 강박적 상황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는 폐쇄적 공포와 배제의 폭력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을까. 많은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환대는 낯선 접촉을 통해서
차이와 만나지 않으려는 폐쇄적 사회에 폭력이 일기 마련이다. 제주에 예멘 난민이 방문한 후, 한국에 예멘 난민 혐오 담론이 판을 칠때, 예멘 난민을 자기 호텔에 무상으로 받아주었던 어느 호텔 사장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 사람들은 예멘 난민을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호텔을 나간 후, 제주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숙박비를 보내오던 예멘 사람들의 면면을, 정작 혐오자들은 모를 것이라던 그분의 말. 접촉 없이 이해와 포용은 없고, 환대도 없다. 소통을 두려워하고, 접촉을 피하는 데서 편견과 혐오가 생긴다. 여기서 폭력이 꿈틀거린다. 사상의 이주민 반상회는 이주민과 함께 이 폭력의 결을 돌파하고 새로운 지역 이야기를 써나가려는, 부산 문화다양성의 교훈이 되려 한다.